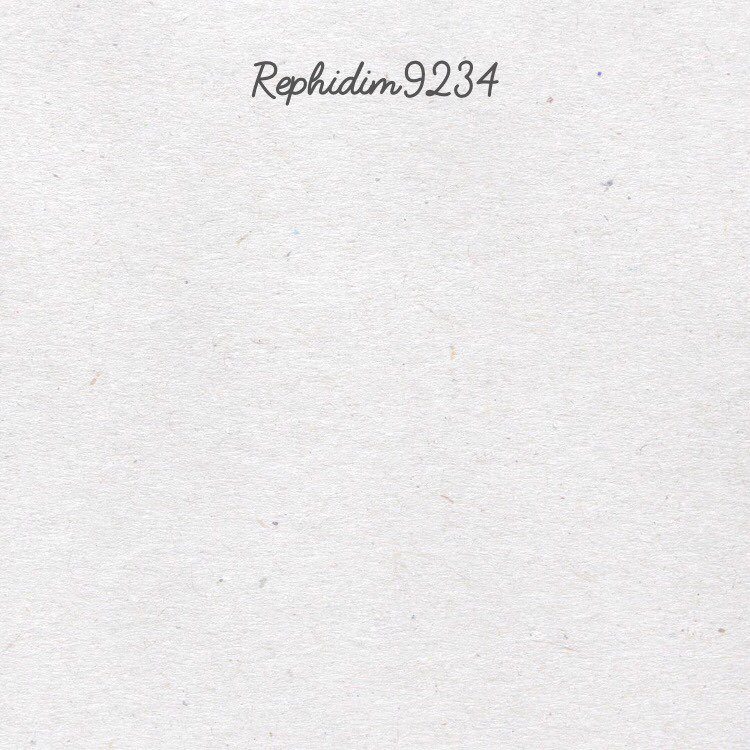92-93-94년생들 ‘친구’로 모여 허물없이 지낸다.
학창시절엔 한 살만 많은 선배가 와도 깍듯이 대했는데 이제는 두 살 많은 형한테도 거리낌 없이 말을 뱉어낸다.
겉보기엔 상마초로 보이는 거친 남정네들이 까페에 모여 두 시간을 떠들어 댄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 비싼 까페 빙수를 하나 씩 입에 물고는 골때리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아마 삶의 무게로 저당잡힌 적당한 청춘을 술 한잔으로 위로 받는 또래들에게 우리네 모습은 퍽 웃긴 장면일 것이다. 덩치는 산 만한 놈들이 술은 쓰다고 콜라를 찾는다. 인생의 쓴 맛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야 임마! 안그래도 인생도 쓰구만 입에 들어가는 것 까지 써야되냐!”는 기가막힌 억지 논리 덕분에 알코올과 함께 돈이 증발될 일은 없는 것 뿐이다.
까페는 우리 추억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 아지트로서, 쉼터로서 서로 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곳이었다. 어른들은 이걸 시간낭비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는 않다. 시덥잖은 농담으로 할애한 과거들이 추억으로 돌아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니 말이다.
소맹형은 까페를 하나 차리려고 한다.
까페명은 ‘Rephidim 9234’
르비딤은 히브리어로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9234는 우리의 태어난 년도를 모은 숫자다.
그는 우리의 쉼을 책임져왔던, 새로운 쉼을 만들어줄 휴식처를 만들려고 한다.
기대가 된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즐겁게 해줄 휴식처.